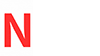“통 크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5·18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서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 소장은 이날 ‘5·18 문제점을 말한다’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 “5·18 관련자와 유족 관련 보상과 지원은 1988년 국민대화합을 위한 상호 이해·용서·상처치유·명예회복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도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5·18 관련자는 조선시대 반정공신이나 최상위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를 별도의 법으로 묶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옛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가 집계한 민주화운동 인정 사례 1만 건 가운데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 사건으로 분류된 것이 인혁당재건위사건·남민전 사건 등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소장은 5·18민주유공자를 참전유공자와 4·19혁명 관련 보훈대상자의 규모와 비교하기도 했다. 김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22만5319명, 4·19혁명 보훈대상자는 888명이지만 5·18민주유공자가 총 4485명이다.
2002년 제정된 5·18유공자법으로 5·18 보훈 대상과 보훈 수준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5·18유공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가 순국선열·애국지사 등이 포함된 국가유공자와 같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5·18민주유공자 규정이 부정이 밀고 들어온 빈틈이 많은 만큼 법률 개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보탰다. 김 소장은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보완해야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과 국가보훈처의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비리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가보훈처를 향해 “5·18유공자법 및 5·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적용 대상과 그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을 받은 사람을 집계해 공개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증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 심사를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장이 관련 심사를 진행하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5·18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권 추구 수단이자 광주지역 일부 시민의 경제적 이권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5·18 관련법은 5·18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매듭지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