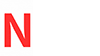국립국악고등학교 동문들의 춤 무대가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목멱(木覓)예인’이다(6.14, 서울돈화문국악당). 국악고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선도하는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정통성을 지닌 학교다. 우리나라 최초 국가 음악기관인 신라시대 ‘음성서’에서 비롯된 국고의 역사적 나이테까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나루아트컴퍼니·나루전통춤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공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 온 동문들이 춤으로 인연의 꽃을 피운 무대로 특별출연 포함 여덟 작품, 여덟 송이의 춤꽃이 ‘무형문화의 향연(饗宴)’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웅숭깊은 문화유산의 춤적 가치를 동시대에 고(告)한 힘을 지닌다.
정든 교정(校庭)을 나선 세월의 흔적을 느낄 틈도 없이 각 작품은 하나하나 씨줄과 날줄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다. 향연에 초대된 관객과 초여름의 여운을 하나씩 채워나간다. 첫 무대는 변상아가 연다. 한예종 출신으로 처용무 이수자인 변상아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를 통해 국고가 지닌 예술적 묵직함과 유구함을 담아냈다. 처용무가 지닌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의미는 코로나19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문화사적 가치까지 담보했다.

이어진 무대는 이번 공연을 기획·연출한 이규미의 ‘신(新)상좌무’다. 이 작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제4과장을 모티브로 해 새롭게 담아낸 춤이다. 탈판을 정화하는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되 춤적인 부분을 강화한 특징을 지닌다. 내재성 강한 춤의 묘미를 내공 있게 잘 풀어냈다.
이규미는 ‘탈 인생’ 그 자체다. 강령탈춤 이수자이자 처용무 전수자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 탈은 이번 무대에서는 ‘해탈(解脫)’과 새로운 춤으로서의 아름다운 ‘일탈(逸脫)’까지 넘나들었다.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는 그녀의 향후 행보도 귀추가 주목된다.

황해도에서 평양으로 시공간을 이동시킨다. 평양검무전승보존회 사무국장이자 정미심댄스컴퍼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심의 ‘평양살풀이’. ‘부루나 살풀이’라고도 불리는 이 춤은 고(故) 이봉애 명예보유자의 고증에 의거해 만든 평양의 대표 춤이다. 단호하되 고독한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침잠(沈潛)과 부유(浮游)의 미학’을 보여 줬다.

가야금의 주 선율에 더해 깊은 춤 향기를 보여 준 강윤주가 ‘태평무’로 순서를 이어받는다. 이번 공연에서의 태평무는 한성준-한영숙-박재희로 이어지는 작품이다. 발놀림·호흡을 비롯해 복식과 장단 등 다양한 면모를 관객 앞에 펼쳤다.
종묘제례악(일무) 이수자, 태평무·김백봉부채춤 전수자로 부단히 춤 학습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윤주는 춤랑예술원 및 강윤주춤랑무용단 대표를 맡고 있다. 작년 국립국악원에서의 개인 발표회 이후 한층 성장된 춤 무대를 보여 줬다.

호적(태평소) 소리가 공간을 채운다. 불협화음 속 조화미의 묘미가 있는 시나위 특성을 이혜정은 ‘호적시나위’를 통해 마음껏 무대에서 펼쳐 낸다. 상체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 전반부에서 즉흥성 강한 시나위의 면모를 자유로움으로 치환시킨 무대다. ‘선비’ ‘낭만’ ‘풍류’를 떠올리게 하는 최현 선생으로부터 그의 제자인 윤성주 현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에 의해 탄생된 이 춤을 이혜정은 자신만의 춤으로 소화했다.
이번 공연은 기본적으로 독무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무(對舞) 형식을 지닌 검무의 특성상 2인무를 통해 ‘평양검무’는 빛나는 검처럼 무대를 빛낸다. 평안남도무형문화재 제1호인 이 춤은 정미심·장지원의 듀엣으로 단정함과 화려함, 강함과 섬세함을 응축시켜 구현했다. 장지원은 평양검무 이수자로 평양검무전승보존회 영재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종이돈 ‘지전’을 양손에 쥐고 추는 ‘지전춤’을 이규미가 이어받는다. 이 춤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축원적 성격이 강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에 속하는 작품으로 호남지방 씻김굿의 이채로움을 이규미의 색깔로 담아냈다.
피날레는 특별출연자 국립무용단 출신 정혁준이 함께했다. 국악중·국악고에서 후학을 양성한 인연이 있다. 국립부산국악원 상임안무자를 역임한 춤꾼이자 교육자·안무자인 그는 이번 무대에서 임이조류 특유의 풍류가 깃든 ‘한량무’를 선사했다. 고고함 속 유유함, 멋과 흥을 집약해 춤맛을 더했다.
학교에서 춤으로 맺은 인연, ‘무연(舞緣)’이 무궁한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 중심에 ‘목멱예인’이 자리 잡고 있다. 콘텐츠는 기획에서 출발하는데 횟수를 거듭하며 성장하는 이 프로젝트는 교정과 사회, 너와 나를 이어 주는 데 기여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