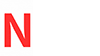그동안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강화되는 가운데 직원 1인당 최대 관리수가 75마리로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관련업계 안팎에서 앞으로 시행될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실릴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중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는 동물장례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등 4개 분류였다. 하지만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개 분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수업 등이 추가된다. 기존 동물장례업은 명칭이 동물장묘업으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동물생산업이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을 뜻한다. 그동안은 동물생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비교적 문턱이 낮은 편이었다.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오는 3월부터 동물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킨 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된 내용이 담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해관계자인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와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작업을 거치고 있다.
동물생산업 최대 관심사 1인당 최대 관리 수…생산자·동물보호단체 절충안 ‘75마리’ 확정

반려동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생산업의 허가 요건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1인당 관리할 동물의 마릿수다. 그동안은 1인당 관리하는 동물의 숫자가 제한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상 거의 방치되다시피 관리되다 보니 동물보호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강아지공장’이란 단어가 파생된 것도 이와 관련 깊다.
개정안 통과 이후 반려동물업계에서는 1인당 관리할 동물의 마릿수를 두고 각종 견해가 분분했다. 생산자단체는 인건비 문제 등을 이유로 1인당 100마리를 고집한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최대 50마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밝혀졌다. 양측이 조율한 합의점은 ‘75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1인당 50마리로, 생산자단체에서는 1인당 100마리로 각각 지정해 줄 것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는 양측의 중간 수치인 75마리로 결정 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단체 측 역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조시종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은 “1인당 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동물 숫자는 75마리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이 부분을 확정 짓고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철장 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들…평평한 바닥 설치 비율 두고 갑론을박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는 ‘뜬장’ 문제가 꼽힌다. ‘뜬장’이란 동물들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을 뚫은 개장을 뜻한다. 현재 동물생산업 신고 기준에는 ‘바닥에 다리가 빠지지 않을 크기의 구멍’까지 허용하고 있다.
촘촘하게 만들어진 바닥의 경우 다리가 빠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뜬장을 100% 허용하고 잇는 셈이다. 생산자 입자에서는 번거롭게 배설물을 치울일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돼 왔지만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를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최인영 러브펫 동물병원 대표원장은 “사람을 계속 바닥이 철망인 상자 속에 가둬 놓는다면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다”며 “동물도 바닥이 뚫려 있는 개장 속에 오래 가둬져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생산자단체와 동물보호단체 간에 뜬장은 허용하되 바닥의 일부를 안심하고 발을 디딜 수 있는 평평한 판을 깔아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평평한 면적의 비율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종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장은 “각 개장의 바닥 면적의 일부를 개들이 안심하고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평평한 판 등으로 깔아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문제는 어느 정도 비율을 깔아주는 것이냐는 문제다”고 말했다.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바닥을 깔아주는 비율은 아직 얼마나 깔아줄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적장한 바닥의 비율은 동물보호단체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에서는 평평한 바닥 비율을 3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60~90%까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준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 연말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전까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