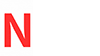일이든 놀이든 그것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즐거운 에너지와 열정이 충분히 전해진다.
2일 시작된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17일 공연된 ‘세상의 모든 피아노’ 시리즈 중 마케도니시모의 음악이 그랬다. ‘마케도니시모’는 마케도니아의 전통음악, 특히 각 지역의 댄스 음악을 피아노·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퍼커션 같은 친숙한 서양 악기로 연주하면서 그 나라 민속음악에 대한 마음의 문턱을 낮춰 줬다.
선율보다 리듬 중심인 마케도니아의 민속음악은 한국의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처럼 빠르게 연주되었다. 피아니스트 시몬 트릅체스키의 리드미컬하고 현란한 피아노 연주는 그도 직접 얘기했듯 프로코피에프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난해했다.
BBC 뉴제너레이션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트릅체스키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각 팀원을 소개했다. 아티스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지는 소개였고 트릅체스키의 뛰어난 리더십이 느껴진 순간이었다.

연주 내내 그들이 주고받는 시선과 음악, 무대매너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퍼커셔니스트는 심지어 우리나라 장구 같은 것을 메고 연주하기도 했다. 마림바 연주도 수준급이었다.
클라리넷 연주자는 색소폰과 터키 목관악기인 카발이라는 악기까지 뛰어나게 연주했다. 각 파트별 연주가의 기량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9/8, 11/8 같은 빠른 박자에서도 서로의 호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주한 것이 대단했다.
앙상블은 ‘하나’가 되는 것이 관건이다. 각자의 색을 드러내는 것보다 한 사람이 연주하듯 같은 호흡으로 연주할 때 이상적인 음악이 된다.
경계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공통된 관심분야와 주제가 있을 때다. 그것이 음악이라면 경계는 더 빨리 없어진다. 클래식을 공부한 연주자들이 전통 음악을 클래식 악기로 연주해 클래식 장르화한 것은 신기하고 경이로웠다.
대부분의 음악이 댄스 음악이었고 피아노가 타악기처럼, 클라리넷이 현악기처럼, 첼로는 목관악기처럼 연주됐다. 어떤 악기도 원래의 고유한 악기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았다. 국내 최초의 야외 음악당인 ‘뮤직텐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이었다.

뮤직텐트에서 듣는 음악은 경계를 사라지게 했다. 바깥 공기와 소리가 들락거리고 연주하는 음악이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구조다. 축음기의 나팔관을 엎어 놓은 듯한 형상을 가진 지붕은 장소의 명칭대로 텐트로 되어 있다.
음악도 공간도 경계가 없으니 관객도 하나가 되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소리도 조화롭게 음악당으로 밀려 왔다. 마을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흥겹게 음악을 감상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축제에 물들 수 있었다.

낯설고 새로운 자극은 삶의 윤활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음악은 처음엔 생소하지만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이미 그 음악은 우리의 뇌를 마사지한다.
색다른 리듬과 음악에 거리감이 느껴진 건 잠시였다. 피아니스트 트릅체스키가 민속음악을 육성으로 노래하며 관객에게 손뼉 치기를 유도했다. 앙상블이 서로를 보고, 듣고, 맞추어 가듯 마을 축제 같은 마케도니시모의 공연은 관객을 보고, 듣고, 맞추어 갔다.
생소했던 음악에 대한 분별을 넘어서 그들의 음악에 동화되고 ‘마침내’ 정화되어가는 단계를 경험했다. ‘마케도니아의 국가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은 트릅체스키와 그의 팀이 선물한 마법의 시간이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