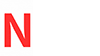파리올림픽이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다. 일본 사람과 문화를 탐구해 온 필자로서는 묵직한 숙제를 안게 된 시간이었다. 올림픽경기 현장에서 일본 유도 선수가 보인 패배의 눈물 때문이다.
1970년대에 나온 일본인론 ‘공기의 연구’라는 명저가 있다. 저자 야마모토 시치헤이가 논한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무언의 압박, ‘공기의 힘’이 눈물의 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양한 인간 감정의 중심에 기쁨과 슬픔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표정과 눈물만으로 감정이 전달될 수 있다. 눈물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분하고 억울해서, 때로는 심신이 아프거나 외롭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맺히는 눈물·펑펑 솟는 눈물·큰 소리를 내는 울음 등 우는 방식도 가지가지다.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 눈물이란 대체로 고통과 절망에 관한 신호의 한 종류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가져오기도 한다.
파리올림픽 눈물 논란은 유도 여자 52kg급 2회전에서 절대 강자 우승후보였던 아베 우타(阿部 詩)가 패배하면서 발생했다. 일본 매체들에는 “당연시했던 올림픽 2연패의 꿈이 사라졌다” “기대가 무너져 충격이다”는 등의 멘트가 주로 실렸다. 당시 아베 선수는 시합장 다다미 위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탈해하더니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참 지나 코치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퇴장하는 동안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울렸다. 관례인 경기 직후의 인터뷰에마저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발표까지 나왔다.
아베 선수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국제 무대에서 보인 흐트러진 태도에 비판이 일었다. 전 미야쟈키현 지사인 히가시고쿠바루 씨가 “누구나 경기에 질 수 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다른 선수의 다음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슬픔을 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자 일시에 동조자가 급증했다. 마치 ‘공기의 힘’이 작용하는 느낌이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아베 선수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는 바람에 지나친 공격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나섰을 정도였다. ‘메이와쿠 문화’의 일본인답게 아베 선수 또한 사과 글을 올렸다.
일본인들은 좀처럼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감정이란 모름지기 절제하는 게 미덕인 것이다. 그것은 지진·해일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서 터득한 지혜일지 모른다. 일본인들의 이런 태도를 두고 ‘기쁨도 슬픔도 잠시라는 깨달음’ ‘감정에 침몰되선 안 된다는 생존의 철학에서 생겨난 습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엄청난 피해와 사상자 규모에도 울부짓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찔끔찔끔 울었다’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다. 당시 일본 TV 시사 프로그램의 한 패널이 말했다. “왜 저렇게밖에 못 울까. 한국인들을 보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니·아버지 하면서 절규한다. 일본인들도 슬픔을 마음껏 표현해야 한다.”
그 반세기 전에도 그랬다. 1945년 8월 종전(사실상 패전) 당시의 모습을 보도한 사진들을 보면 패전을 알리는 천황의 목소리를 라디오방송으로 들으며 무수한 일본인이 조용히 꿇어 앉거나 엎드려 눈물짓는 모습뿐이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이 없다.
일본인들은 기쁨의 표현에도 서툰 편이다. 일본에선 박장대소하며 화끈하게 기뻐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 줄 웃음과 친숙하지 않다는 것은 딱한 일이다. 해학을 표현한 우리나라의 탈춤과 일본 가무극 노(能)를 보라. 한·일 간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면이 활짝 웃는 하회탈이라면 일본의 탈은 무표정 내지 웃을 듯 말 듯한 가면들뿐이다.
감정을 지나치게 자제하면 마음에 응어리를 만들고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이다. 마음의 치명적 독소를 씻어 내는 물꼬를 터 줄 웃음과 울음 대신 일본인들은 ‘공기의 힘’으로 독소를 품고 사는 것 같다. 일본이 세계 최고 장수국이라는 게 의아할 지경이다.
언어 생활에서도 그렇다. 일본인은 크고 작은 감사를 표해야 할 경우에조차 ‘스미마셍’이라며 사과의 표현을 즐겨 쓴다. 사소한 친절에도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진정성보다 상투적이라는 인상을 줄 때도 많다. 오래전 미국 주요 일간지에서 ‘스미마셍’ 특집을 다뤘을 정도다. 일본인은 다른 언어권에 살 때도 사과의 표현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인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행복도는 58위였다.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다. 이런 현상은 어쩌면 희로애락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관습과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감정을 잘 억누르는 그들의 모습에서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배우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공기의 힘’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웃음이란 전염성을 띤다. 남이 웃어 덩달아 웃게 되면 그것도 일정한 웃음의 효과를 낳는다. 되도록 통쾌하게 웃을수록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흘러간 훌륭한 문화가 많지만 웃음도 그것에 포함됐으면 한다. 파안대소 하회탈의 웃음 바이러스를 일본에 많이 전염시키고 싶다.
후원하기